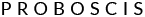엔딩.
written by 가은
현관 앞에 서면 무릎까지 찬 피로가 벗겨진 신발 아래로 쏟아져내리는 날이 있다. 고작 7평 남짓의 작은 단칸방이 내겐 유일한 숨통이었다. 월세 50만원으로 손에 쥔 오롯이 내 것인 행복. 비좁아도 티비부터 소파, 게임기까지 있을 건 다 있어.
물 먹은 듯 둔해진 발을 디뎌 침대 위로 다이빙했다. 매트리스면에 얼굴이 맞닿아 있어 불편한데도, 돌아눕는 일마저 버겁게 느껴졌다. 늘어진 생선처럼 지느러미 팔딱일 힘도 없다. 목 부근을 조여오는 빳빳한 셔츠깃은 족쇄 같았다.
숨 막혀.
깃 중앙을 아래로 당기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숨을 크게 내뱉었다. 그제서야 호흡의 템포가 정상 범주로 환원했다. 가로로 보는 세상은 간판의 네온사인이 번져 요란했다. 커튼 걷힌 통창을 횡단한 보랏빛이 불 꺼진 방안을 물들였다.
불을 켜지 않아도 적당히 환하고 적당히 숨어들 수 있는 밤이었다.
원체 억센 옷을 싫어한다.
흐물한 게 좋아. 흐물하고 몸을 따라 잘 늘어지는 옷.
더불어 사방이 뚫려 있는 옷을 좋아해서 옷장에는 길고 품 넓은 민소매가 줄지어 걸려 있다. 달라붙지 못하고 살갗 위를 부유하는 셔츠를 속히 벗어던지고 옷장 문을 열었다.
얘들은 비슷해 보인다지만 다 달라.
어느 건 끄트머리에 큐빅 로고가 새겨져 있고, 어느 건 목부근에 예쁜 라벨이 달려 있다. 어느 건 눈에 띄게 해졌지만 그게 내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사랑스럽고, 이건 무려 본더치 한정판이라고.
큼지막한 반바지는 애착하는 한 벌이면 됐다. 온통 좋아하는 것들뿐이라 손에 잡히는대로 꺼내 입고 기타를 집어들었다. 얘도 옷장 가득 채운 민소매만큼이나 내가 사랑하는 것.
언젠가는 내가 락스타가 될 줄 알았지.
공상적인 꿈도 제약 없이 꿀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품에 교복만 걸쳐도 가능성보다는 현실성을 선두에 둔다. 드러낼 수 있는 꿈과 감춰야 할 꿈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커가는 건 마음의 사슬을 늘리는 일이야.
그렇지만 진짜 락스타가 됐다면 기타 치는 일이 이만큼 행복할 순 없었을지도 몰라.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을 때는 애정을 환전하기도 하니까. 기타 연주는 당연해진 하루 루틴이었고, 자기 전 양치처럼 매일 잊지 않았다. 생각은 비우는 것보다 밀어내는 편이 쉽다. 그 역할에 기타가 적합했던 거고.
악기는 내가 쥐는대로 소리내니 마음이 갔다. 그게 올바른 음이든 어긋난 음이든 일단 내 손길을 쫓잖아. 어디에서 소리가 새어나가는지 집중하다 보면 오롯이 그것만 골몰하게 된다. 어느 곳을 덜 누르고 있는지, 어느 살이 아직 여린지. 단지 한 음을 완성하기 위해 온 감각을 손가락 위로 집중시킨다. 오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외부 잡음들은 단단한 진동 위로 흩어졌다. 어제보다 매끄러워진 소리의 이음새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하루가 쌓였음을 체감했다.
샤워는 사계절 구분없이 뜨거운 물로 한다.
샤워 부스 파티션에 희뿌연 김이 서려야 만족이 됐다. 금방 헹군 머릿칼 끝에는 물기가 엉겨 있었고, 어린이용 치약을 쓰는 탓에 입에서는 소다맛이 감돌았다. 수건을 대충 목에 두르고 침대에 등을 기대 누웠다. 무릎 위로는 노트북을 얹었다. 제법 내려앉은 어스름 덕에 스크린이 선명해서 꼭 영화관 같다.
현대인들 베프라는 넷플릭스보다는 배경화면 유일히 자리한 소장 영화 폴더에 커서를 올렸다. 좋아하는 영화는 꼭 다운로드해서 내 것으로 지니는 고루한 습관이 있다. 영화에는 단숨에 보여지지 않는 언어들이 몹시 많아서 곱씹고 곱씹어야 겨우 체화할 수 있었다. 매일 새로운 영화를 알아갈 여유가 내겐 없었고, 새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낯익은 것을 온전히 알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벌써 열댓 번은 돌려본 영화를 어김없이 재생한다.
사무실에 홀로 앉은 남자, 선홍빛 황혼 아래 차 사고와 배송되는 오르간. 익숙하지만 지겹지 않은 것은 좋아함의 증명이다.
이제는 외워진 여주인공의 엔딩 대사가 끝나면 마림바 소리와 마지막 사운드트랙이 들려온다. 분홍색과 보라색 선들 위로 찬찬히 새겨지는 타이틀과 이름들. 처음 보던 순간에는 크레딧을 보지 않고 화면을 닫았고, 거듭해서 볼 때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시야에 들어오는 이름들이 연일 늘어갔다.
엔딩이 아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본 영화를 재차 보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같지만 다를 오프닝과 엔딩이 있다.
상행하던 수많은 이름들이 전부 자취를 감추면 암전.
나 역시 오늘의 파편들을 베개 뒷편에 감춰놓고, 저무는 화면을 따라 눈을 감는다.